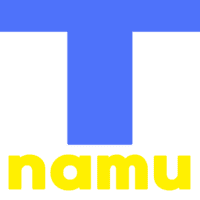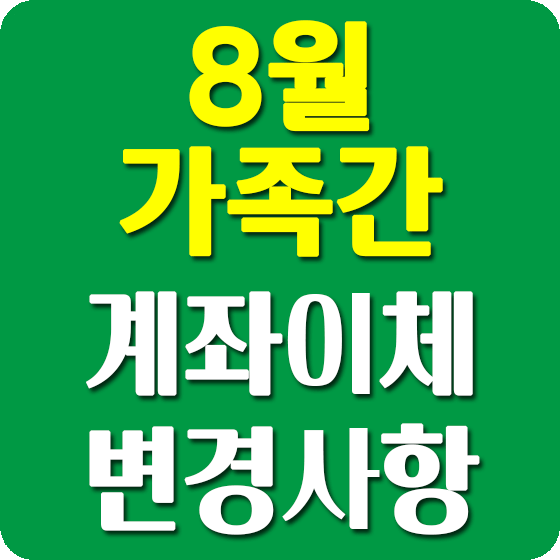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가족간 계좌이체,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
“우리 엄마가 용돈 좀 보내줬는데, 이게 세무조사 대상이라고요?”
“매달 50만 원씩 자식한테 보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?”
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 2025년 8월부터 ‘가족 간 계좌이체’가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.
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일은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, 이제는 그 거래에도 정확한 목적과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, 앞으로 가족 간 이체를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1. AI가 거래 패턴을 감시합니다
기존에는 고액 거래만 세무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.
하지만 이제는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인 가족 간 이체가 있으면, AI가 그 패턴을 분석해 증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“매달 3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”하거나 “같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경우”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.
2. 50만 원 이상 이체도 감시 대상입니다
“50만 원이 무슨 고액이야?”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AI 입장에서는 반복성과 정기성이 중요합니다.
정기적인 금액, 메모 없는 이체, 생활비 이상의 금액은 모두 의심 거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.
소액이라도 ‘매달 같은 금액’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특히 메모 없이 송금하는 건 위험 요소입니다.
3. 가족 전체 거래를 하나로 분석
AI 시스템은 단순히 ‘부모→자녀’의 거래만 보지 않습니다.
가족 구성원 전체 계좌 내역을 연계 분석해서 ‘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’를 추적합니다.
즉, 미성년 자녀 계좌나 배우자 명의로 우회 송금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.
증여세 기준, 다시 확인해볼까요?
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경우, ‘증여세’가 발생합니다.
이 기준은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돼요.
- 💍 배우자 간: 6억 원
- 👨👩👧👦 부모↔성인 자녀: 5천만 원
- 🧒 부모↔미성년 자녀: 2천만 원
- 👨👩 기타 친족: 1천만 원
한도를 넘기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,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.
가족 간 송금,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
1. 이체 메모는 무조건 남기기
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“왜 보냈는지의 기록”입니다.
이체 시에는 반드시 “생활비”, “교육비”, “병원비” 등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세요.
2. 카카오톡·문자 등 증빙자료 확보
돈을 보내기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, 영수증, 진료기록 등은 세무조사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.
증빙은 최소 5년간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
3. 고액 거래는 차용증으로 명확히
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줄 경우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, 상환 계획도 수립하세요.
이자율은 연 4.6% 이상, 상환 내역도 실제로 계좌에 찍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약 2억 1,700만 원입니다.
이를 초과하면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주의해야 할 위험한 거래 패턴
- 💰 매달 같은 금액 반복 송금
- 💬 메모 없이 송금 (특히 금액이 클 경우)
- 🏠 송금 직후 고가 소비나 자산 구매 (차, 부동산 등)
- 🧒 미성년자 계좌 이용해 우회 송금
위의 패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향후 AI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부모 입장에선 사랑의 손길이었겠지만, 국세청 입장에선 의심 거래일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죠?
하지만 세법이 달라졌고, 이제는 AI가 모든 거래를 분석하는 시대입니다.
사랑하는 자녀, 배우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,
이제는 그 마음을 “기록과 증빙”으로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.
이 글을 읽으신 지금부터라도, 거래 하나하나에 의미를 남기세요.
“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”, 꼼꼼한 준비가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.
이미 송금했던 내용도 돌아보세요. 큰 금액은 차용증을 보완하고, 반복 송금은 중단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 변경하세요.